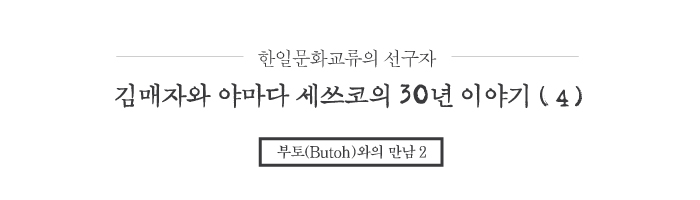글 | 이토 준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
일본 문화 잔재를 청산하는 것 - 이것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해가 미흡한 편이다.
1945년 이전의 한반도는 일본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문화만이 유일한 '정통'이었다. 현재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는 일본식 신사가 세워져있었고, 거리에는 일본노래와 일본출판물, 연극, 영화, 가요… 모두 일본 것뿐이었다. 한국의 고유문화는 억압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술에 취해 노래 한 곡 부르려고 해도 일본 노래밖에 나오지 않아.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필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갔던 90년대에도 한국의 것을 잃어버린 노인들을 만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김매자는 누구보다도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라진 한국 전통무용을 발굴 하는 것이 그녀가 인생을 바치며 하는 일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문화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항상 일본이 우리 전통을 금지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매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인인 필자를 배려해 일부러 미소 지으며 '일본한테 당해 버렸어요~' 라며 웃어넘기려 한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바로 주제를 바꾸어버린다.
그 세대 많은 한국 사람이 그랬듯이 김매자도 옛 종주국인 일본의 망령과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 '허락 받기 어려운' 일본 부토 공연을 하려고 했다. 그 열정은 어디서 난 것이었을까.
당시 대학 교수였던 김매자는 정부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었고, 문학가나 시인 등 문화계 친구들도 많았다. 그 사이에서 '공연은 어렵더라도 워크숍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1985년 5월, 김매자는 당시 근무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앞 자신의 스튜디오인 창무춤터에서 오오노 카즈오와 나카지마 나츠의 부토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일본 부토, 오오노 카즈오에게도 이는 처음으로 아시아에 소개되는 일이었다.
일본 문화 잔재를 청산하는 것 - 이것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해가 미흡한 편이다.
1945년 이전의 한반도는 일본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문화만이 유일한 '정통'이었다. 현재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는 일본식 신사가 세워져있었고, 거리에는 일본노래와 일본출판물, 연극, 영화, 가요… 모두 일본 것뿐이었다. 한국의 고유문화는 억압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술에 취해 노래 한 곡 부르려고 해도 일본 노래밖에 나오지 않아.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필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갔던 90년대에도 한국의 것을 잃어버린 노인들을 만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김매자는 누구보다도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라진 한국 전통무용을 발굴 하는 것이 그녀가 인생을 바치며 하는 일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문화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항상 일본이 우리 전통을 금지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매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인인 필자를 배려해 일부러 미소 지으며 '일본한테 당해 버렸어요~' 라며 웃어넘기려 한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바로 주제를 바꾸어버린다.
그 세대 많은 한국 사람이 그랬듯이 김매자도 옛 종주국인 일본의 망령과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 '허락 받기 어려운' 일본 부토 공연을 하려고 했다. 그 열정은 어디서 난 것이었을까.
당시 대학 교수였던 김매자는 정부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었고, 문학가나 시인 등 문화계 친구들도 많았다. 그 사이에서 '공연은 어렵더라도 워크숍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1985년 5월, 김매자는 당시 근무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앞 자신의 스튜디오인 창무춤터에서 오오노 카즈오와 나카지마 나츠의 부토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일본 부토, 오오노 카즈오에게도 이는 처음으로 아시아에 소개되는 일이었다.
舞踏와 BUTOH
 "그런데 오오노 선생님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용가뿐 아니라 여러 문화인들도 모여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춤만 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오노 선생님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용가뿐 아니라 여러 문화인들도 모여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춤만 추시는 거예요."
김매자는 몇 번씩 물어봤다.
"선생님, 부토의 메소드는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다."
이제 김매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유쾌하게 웃는다.
김매자가 당황했던 지점은 세계 곳곳에서 쓰인 수많은 '오오노 카즈오 론'의 핵심 부분이었다. 오오노 카즈오가 그 워크숍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필자가 과거에 오오노 카즈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김매자에게 전했더니,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오오노 선생님은" 하며 막 웃었다.
오오노 카즈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토가 무엇인가?', '오오노 카즈오의 춤이란?'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 왔다. 그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부토관과 세계관을 피력해왔다. 적어도, 과거에 필자가 참가한 몇 차례의 기자회견에서도 카즈오의 말은 곧 그의 춤처럼 풍경 속에서 즉흥적으로 선택된듯한 말들이었다.
그런 오오노 카즈오의 말은 한 권의 책에도 정리되어 있고, 수많은 논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무척이나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대사가 있다.
'나는 유령이 되어, 유령의 모습을 빌려 유령과 만나고 싶다. 그 손을 유령에게 뻗어 찾아내야만 한다.'
이 대사는, 어떻게 보면 김매자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성스레 재현해 낸 한국정통무용의 세계관과도 겹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무렵 일본의 부토는 'Butoh'로서 서양에서 선풍적으로 소개되고, 예술가와 비평가들은 새로운 일본의 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중 많은 의견들은 부토를 신선하고 충격적이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서양의 시선과 문맥에서 해석한 것 같았다. 이질적인 것=일본적인 것=동양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소위 '오리엔탈리즘' 이었다.
물론 가장 처음 히지카타 타츠미가 제창한 '舞踏'에는 안짱다리, 짧은 다리와 같은 일본인의 신체성에 대한 고집과, 노(能)나 가부키와 같은 일본 전통예능 및 토착성으로의 회귀의식이 들어있다. 따라서 서양인들이 먼저 그 부분에 주목한 것을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토의 창시자인 타츠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시 차세대 무용가들은 오히려 "舞踏라는 새로운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또한 서양에서 일어났던 '부토 붐'은 서구의 땅의 사람들까지 무용수로 맞이해 일본인의 육체를 바탕에 둔 기존의 동기 자체를 포기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이미 당시 80년대 일본 무용가들이 보고 자란 풍경은 히지카타 타츠미가 겪은 옛날 일본 농촌이 아닌, 도쿄 중심의 화려하고 아방가르드한 70년대 문화 열풍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적 풍토와 일본인의 신체라는 초기의 동기와 멀어진 舞踏는, 일본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Butoh라는 전위예술 장르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김매자는 몇 번씩 물어봤다.
"선생님, 부토의 메소드는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다."
이제 김매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유쾌하게 웃는다.
김매자가 당황했던 지점은 세계 곳곳에서 쓰인 수많은 '오오노 카즈오 론'의 핵심 부분이었다. 오오노 카즈오가 그 워크숍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필자가 과거에 오오노 카즈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김매자에게 전했더니,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오오노 선생님은" 하며 막 웃었다.
오오노 카즈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토가 무엇인가?', '오오노 카즈오의 춤이란?'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 왔다. 그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부토관과 세계관을 피력해왔다. 적어도, 과거에 필자가 참가한 몇 차례의 기자회견에서도 카즈오의 말은 곧 그의 춤처럼 풍경 속에서 즉흥적으로 선택된듯한 말들이었다.
그런 오오노 카즈오의 말은 한 권의 책에도 정리되어 있고, 수많은 논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무척이나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대사가 있다.
'나는 유령이 되어, 유령의 모습을 빌려 유령과 만나고 싶다. 그 손을 유령에게 뻗어 찾아내야만 한다.'
이 대사는, 어떻게 보면 김매자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성스레 재현해 낸 한국정통무용의 세계관과도 겹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무렵 일본의 부토는 'Butoh'로서 서양에서 선풍적으로 소개되고, 예술가와 비평가들은 새로운 일본의 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중 많은 의견들은 부토를 신선하고 충격적이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서양의 시선과 문맥에서 해석한 것 같았다. 이질적인 것=일본적인 것=동양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소위 '오리엔탈리즘' 이었다.
물론 가장 처음 히지카타 타츠미가 제창한 '舞踏'에는 안짱다리, 짧은 다리와 같은 일본인의 신체성에 대한 고집과, 노(能)나 가부키와 같은 일본 전통예능 및 토착성으로의 회귀의식이 들어있다. 따라서 서양인들이 먼저 그 부분에 주목한 것을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토의 창시자인 타츠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시 차세대 무용가들은 오히려 "舞踏라는 새로운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또한 서양에서 일어났던 '부토 붐'은 서구의 땅의 사람들까지 무용수로 맞이해 일본인의 육체를 바탕에 둔 기존의 동기 자체를 포기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이미 당시 80년대 일본 무용가들이 보고 자란 풍경은 히지카타 타츠미가 겪은 옛날 일본 농촌이 아닌, 도쿄 중심의 화려하고 아방가르드한 70년대 문화 열풍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적 풍토와 일본인의 신체라는 초기의 동기와 멀어진 舞踏는, 일본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Butoh라는 전위예술 장르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야마다 세츠코? 이것도 부토?
"처음 야마다 세츠코의 춤을 비디오로 봤을 때, 이것도 부토인지 놀랐습니다. 나카지마 나츠처럼 기모노를 입고 추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김매자에게 부토는 여전히 Butoh이고, 흰 얼굴을 한 가부키의 전통이 있거나, 기모노같은 일본풍 소품을 사용하는 식의 막연한 이미지가 있던 모양이다. 물론 진홍의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오오노 카즈오나 화려한 산카이 주쿠의 무대도 보긴 했다. 그러나 야마다 세츠코의 춤은 그들의 Butoh와 또 달랐다.
김매자에게 야마다 세츠코 영상을 보여준 사람은 이병훈 씨(63)였다. 현재는 국립극단 차세대 센터 소장. 대한민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베테랑 연출가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병훈 씨를 찾아봤다. 1988년에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다음해 1989년에는 동아연극상 연출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이 나온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젊은 연극인 이병훈 씨의 프로필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다. 1981년 동랑레파토리극단 연출부 전, 1972년 서울시립무용단 경력이 있었다. 기존에 무용가였던 것일까?
12월 초, 대학로에서 이병훈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지정한 장소는 신기하게도 8월에 야마다 세츠코와 같이 간 카페였다. (그곳에서 야마다 세츠코와 나눴던 이야기가 이 연재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 호에 실린 글에 썼다)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고 말하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확실히 있다'며 이병훈 씨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김매자 선생님에게 야마다 세츠코의 영상을 보여준 것도 우연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운명이었죠."
김매자에게 보여준 비디오는 우연히 일본친구한테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 부토가인데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춤을 추고 싶다고 하셨어요."
"작품의 제목은 기억하세요?"
"그래 뭐였지… 가을, 무슨 가을이었는데"
"천공의 가을!"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이런, 그것이 있구나. 그 <천공의 가을>은 필자도 야마다 세츠코의 춤을 접한 첫 작품이었다. 김매자도 그걸 봤구나. 김매자가 한 말이 생각났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테크닉도 있고, 대단한 무용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춤은 여태 본 적이 없었어요."
이어진 김매자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다.
"그냥 몸 이었어요. 몸 그 자체."
이렇게 야마다 세츠코는 첫 한국공연을 가지게 된다.
다음 호에는 야마다 세츠코,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처음 야마다 세츠코의 춤을 비디오로 봤을 때, 이것도 부토인지 놀랐습니다. 나카지마 나츠처럼 기모노를 입고 추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김매자에게 부토는 여전히 Butoh이고, 흰 얼굴을 한 가부키의 전통이 있거나, 기모노같은 일본풍 소품을 사용하는 식의 막연한 이미지가 있던 모양이다. 물론 진홍의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오오노 카즈오나 화려한 산카이 주쿠의 무대도 보긴 했다. 그러나 야마다 세츠코의 춤은 그들의 Butoh와 또 달랐다.
김매자에게 야마다 세츠코 영상을 보여준 사람은 이병훈 씨(63)였다. 현재는 국립극단 차세대 센터 소장. 대한민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베테랑 연출가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병훈 씨를 찾아봤다. 1988년에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다음해 1989년에는 동아연극상 연출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이 나온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젊은 연극인 이병훈 씨의 프로필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다. 1981년 동랑레파토리극단 연출부 전, 1972년 서울시립무용단 경력이 있었다. 기존에 무용가였던 것일까?
12월 초, 대학로에서 이병훈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지정한 장소는 신기하게도 8월에 야마다 세츠코와 같이 간 카페였다. (그곳에서 야마다 세츠코와 나눴던 이야기가 이 연재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 호에 실린 글에 썼다)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고 말하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확실히 있다'며 이병훈 씨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김매자 선생님에게 야마다 세츠코의 영상을 보여준 것도 우연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운명이었죠."
김매자에게 보여준 비디오는 우연히 일본친구한테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 부토가인데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춤을 추고 싶다고 하셨어요."
"작품의 제목은 기억하세요?"
"그래 뭐였지… 가을, 무슨 가을이었는데"
"천공의 가을!"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이런, 그것이 있구나. 그 <천공의 가을>은 필자도 야마다 세츠코의 춤을 접한 첫 작품이었다. 김매자도 그걸 봤구나. 김매자가 한 말이 생각났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테크닉도 있고, 대단한 무용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춤은 여태 본 적이 없었어요."
이어진 김매자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다.
"그냥 몸 이었어요. 몸 그 자체."
이렇게 야마다 세츠코는 첫 한국공연을 가지게 된다.
다음 호에는 야마다 세츠코,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